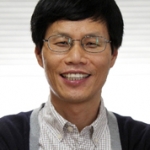
‘세모신협’ 관련 보도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정체성
김창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뉴스가 들려왔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일부 신용협동조합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온 의혹을 금융당국이 적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세운 신협이 유 전회장과 자녀 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66억 원을 송금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게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30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명단에는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을 포함하여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들어있다(한겨레, 2014년 5월 19일, 20일치).
최근 몇 년 동안 농협은행이 거듭하여 전산사고를 내면서 협동조합으로서는 물론 하나의 금융기관으로서도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게 된 계기가 된 세월호 사태 와중에 협동조합금융기관의 탈선 행태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 비통한 심정에 탄식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유병언 일가의 신협 계좌에서 타행에 송금하면서 세모신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됐을 뿐 신협 자금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 적자조합은 건전성 강화 조처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의 요인도 있었다”는 신협중앙회의 해명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소에도 협동조합 강의 때마다 초기 한국신협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려고 노력해왔다. 미국 출신 메리가별 수녀와 한국의 장대익 신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4월혁명이 분출한 1960년에 탄생한 신협은 1970년대 초반까지 충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안적인 사회경제운동의 면모를 견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여 아시아신협의 발전모델로까지 평가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 성동구의 ‘논골신협’을 비롯하여 건전한 일부 단위신협 관계자들이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면서, 신생협동조합들에게 아름다운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보아왔다.
따라서 세모신협 관련 보도는 더욱 더 아프게 다가온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협동조합 일반이 그러하지만, 특히 금융부문 협동조합은 평소 조합원과 대중의 ‘신뢰’가 그 존재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신협이나 농·수협은행이 소수 이사진이나 경영진, 폐쇄적인 직원이나 조합원들만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밀실경영으로 불신을 자초한다면, 상업적 이윤추구를 절대목표로 삼는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들이 정부당국자나 언론에 의해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19세기 중반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로 확산된 신협 또는 민중금고는 당시 절실했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농민과 도시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기관으로서 출발했다. 오늘날까지도 캐나다 퀘벡의 데잘댕금융그룹, 스페인 바스크지역의 몬드라곤은행, 그리고 네덜란드의 라보방크 등 대형은행급으로 성장한 신협들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소규모의 주민 자조조직으로서 신협은 사회금융의 역할은 물론 전체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총자산 56조원을 가진 한국의 신협 942곳, 총자산 112조원에 3200개 점포를 가진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그 많은 농·수협은행 중 과연 몇 개나 ‘대안금융’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신협의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부당국의 ‘부당한 감독’이나 언론기관의 ‘피상적인 보도태도’를 시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관계자들의 교육과 인식의 제고가 더욱 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