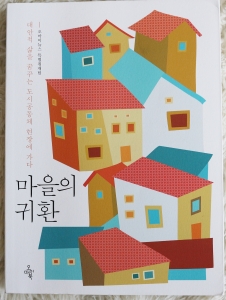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이다
『마을의 귀환』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에 가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 오마이북 2013.09.05.
이상미, 아이쿱시민기자단
<전라도닷컴>이라는 잡지를 보면 호젓한 마을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마을회관에 모여 자랑을 하신다.
“내가 이 마을에 시집온 게 몇 살이었는데 그 때 이 마을은 다들 곤궁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고 이날입때까지 품을 팔아 자식 몇을 거두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왔다는 이야기며 마을 공동제사와 서낭당 이야기, 병이 들어 서울간 이웃집 할매와 그 자식들” 이야기를 보릿자루 풀어 씨종자 고르듯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한다. 둥그렇게 모인 어른신들 한가운데는 흩어진 동전과 화투장이 굴러다니거나 푸짐한 푸성귀와 된장찌개가 여러 개 밥사발 사이를 걸치며 한가운데 퍼질러있기 마련이다.
이런 게 우리네 사는 흔하디흔한 모습이었는데…… 척박한 도시생활에 아이들마저 ‘휴거(‘휴먼** 거지’. 모 브랜드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지칭한다고 한다.)’라는 말로 부에 따라 마을 친구를 조롱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우리는 함께 밥 먹고 아이를 키우며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꿈꾸게 되었다. 90년대 후반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꿈을 키우기 시작하더니 2012년 어느새 전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숲을 이루게 되었다.
그 현장을 찾아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담은 마을공동체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1,000개 마을이 있다면 각기 다른 1,000개의 모양과 1,000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마을공동체는 ‘서울에 이런 마을이 있었나?’ 싶게 생소한 것부터 시작해 ‘아, 거기!’ 다 싶은 꽤 알려진 곳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 돌봄 공동체와 대안학교,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마을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원전 하나 줄이기’를 목표로 꾸준히 절전운동을 펼치는 에너지자립 공동체도 있고, 허물고 다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고치고 단장해서 다시 사용하는 대안개발 공동체도 있다. 콘크리트 아파트에 함께 텃밭을 가꾸어 먹을거리를 나누는 아파트 공동체와 지역주민과 관계망을 형성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장공동체까지 종류도 방식도 다 다르다. 이들 마을공동체를 잇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더불어 함께 살기’다. 주민 스스로 필요해서 만들었고 함께 지속하며 살아갈 미래를 꿈꾼다. 마을공동체가 지자체의 지원없이도 스스로 자립하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는 영국 런던과 그 주변 지역을 방문해 답을 찾으려한다. 런던 올드 스트리트에서 만난 마을만들기 사업체연합 ‘로컬리티’의 스티브 클레어는 ‘로컬리티’ 연합체의 가치를 스스로 발전을 위해 애쓰는 자조(Self-help)와 사업을 통해 이윤을 재투자하는 공동체역량 강화라고 말한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스스로가 사업 모델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도 맞는 혁신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껏 노력해 이룬 마을공동체가 정체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위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자조의 힘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용산 재개발 참사의 비극을 떠올리며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가진 주민들 목소리를 모두 귀담아 차별과 격차를 극복하고 마을발전에 반영해나가는 영국의 지자체와 주민단체의 협력 관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정신적 지주 호세 마리아 신부는 ‘공동체 발전의 핵심요소는 주민 자신이고 주민전체를 활력 있게 만드는 정신이다.’고 말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이다.





